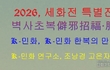K-컬처 김학영 기자 | 정교한 묘사도, 화려한 색도 없다. 오직 몇 개의 선과 여백뿐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선은 오래 머문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추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그림에서 위엄 있게 앉아 있지 않다. 얼굴은 윤곽만 남았고, 표정은 없다. 설법을 하거나 손짓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뿐이다. 그 고요함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듣고, 배워야 안심하기 때문이다.
그 부처님 곁에는 작은 존재 하나가 있다. 스님도 아니고, 수행자라 부르기에도 애매한 사람. 그는 ‘불자’다. 완성되지 않은 존재, 아직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지만, 간절함이나 비장함은 없다. 두 손을 모은 자세는 공손하지만, 절박하지 않다. 마치 “여기에 잠시 있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듯하다.
이 그림의 왼편에 쓰인 한 글자, ‘佛’. 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다. 이 장면에서 ‘佛’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도착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표식이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좌표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도, 불자도 아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둘 사이에 놓인 여백이다. 말이 오가지 않는 거리, 설명이 개입하지 않는 공간, 깨달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는다.
부처님은 완성되었기에 말하지 않고, 불자는 미완이기에 묻지 않는다. 대신 둘은 함께 앉아 있다. 이 장면은 가르침이 아니라 이야기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장면이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의 기록이다.
나는 이 그림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다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앉아도 괜찮겠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었을 뿐이다. 부처님은 여전히 말이 없고, 불자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분명히 하나의 질문이 들려온다.
지금, 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