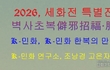K-컬처 이성준 기자 | k-민화에서 공작은 부귀와 영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현숙 작가의 '비파공작'은 이 익숙한 상징을 한 단계 낮은 음역으로 끌어내린다. 이 작품에서 공작은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고, 눈부시지만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다. k-민화가 지켜온 절제의 미학이 이 작품의 화면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비파나무 아래, 공작은 기다린다.
비파는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나무다. 꽃과 열매, 잎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이 식물은 ‘축적된 시간’을 상징한다. 한현숙은 공작을 비파나무 곁에 둠으로써, 부귀를 단발의 행운이 아닌 인내의 결과로 다시 정의한다.
공작의 꼬리는 펼쳐지지 않았다. 대신 바위에 기대어 흐르듯 내려온다. 이는 승리를 과시하는 몸짓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아는 존재의 태도다.
색은 많되, 소리는 낮다.
이 작품의 색채는 분명 풍부하다. 청록, 남색, 금빛, 그리고 비파 열매의 따뜻한 황색이 화면을 채운다. 그러나 그 조합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지킨다. k-민화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다. 아름다움은 높일수록 값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될수록 깊어진다고...
두 마리 공작, 하나의 질서
화면 속 공작은 한 쌍이다.
앞선 공작은 바위를 딛고 서 있고, 뒤의 공작은 몸을 낮춘다. 이는 우열의 대비가 아니라 역할의 분담이다. 민화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부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유지되는 상태다.
이 장면은 말한다.
성취는 독점이 아니라 공존의 결과라고.
K-민화가 말하는 ‘보여주지 않는 힘’
오늘의 사회는 끊임없이 드러내기를 요구한다.
성과를, 성공을, 자신을.
그러나 한현숙 작가의 '비파공작'은 조용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
보일 수 있을 때에도, 굳이 펼치지 않는 선택.
이미 충분할 때, 더 욕심내지 않는 태도...
이 작품 속 공작은 묻지 않는다.
“나를 보라”고.
대신 이렇게 서 있다.
“나는 이미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오래 본다.
보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 남는다.
K-민화가 지닌 힘, 그 깊이는 바로 이런 침묵의 품격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