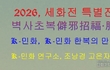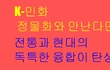K-컬처 김학영 기자 | 전통 민화의 세계에서 ‘화조도花鳥圖’는 가장 따뜻하고 서정적인 장르다. 꽃과 새가 한 화면에 자리하며 풍요·화합·사랑·평안을 상징하는 그림. 홍태현 작가의〈화조도〉는 이 전통적 도상을 현대 민화의 색감과 기교로 재해석하며, 고요한 정원의 한 장면을 따뜻하게 펼쳐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새의 머리를 장식하는 진한 청색靑이다. 이 색은 조선 후기 민화가 즐겨 사용한 상징적 색채로, 맑음·순수·고결함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 고유의 ‘한국적 파랑’을 새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그 존재를 단순한 자연의 새가 아닌 길의 기운을 머금은 신성한 존재로 끌어올린다. 그 아래 은은한 회색의 깃털들은 생생한 사실성과 함께 전통 채색화의 정교함을 보여준다.
작품 속 두 마리의 새는 서로를 향하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 가까운 거리에서 조용히 ‘머문다’. 이 관계성은 화조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풍요로운 가정, 조화로운 부부, 혹은 인연의 따뜻함을 상징한다. 홍태현 작가는 새의 표정과 시선을 과장하지 않은 채 절제된 감정으로 그려 ‘편안함’의 정서를 극대화한다. 이는 전통 민화의 소박함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가 머무는 나무에는 둥근 황금빛 열매가 열려 있다. 이 열매는 민화에서 만복萬福과 길운吉運을 상징한다. 주변의 녹엽綠葉은 생명력의 확장을 의미하며, 아래쪽에 피어난 붉은 모란은 부귀·영화·번영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모란의 색을 담아낸 홍태현 작가의 붓은 전통 모란도의 고졸한 표현과 현대적 채색의 선명함을 절묘하게 조화시킨다. 붉고 화사한 꽃잎은 화면 전체의 균형을 잡으며 새와 열매를 감싸는 ‘길상의 무대’를 만든다.
홍태현 작가의 화조도는 불필요한 장식을 더하지 않고 배경을 넓게 비워 관람자의 마음이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꽃과 새, 열매와 나무가 각자 제자리를 빛낼 수 있는 ‘마음의 무대’다. 전통 동양화에서 여백은 곧 자연이자 철학이며, 비움으로써 완성되는 풍경을 의미한다. 홍 작가는 이 여백을 통해 그림 속 조화와 고요를 한층 깊게 끌어올린다.

홍태현 작가의 〈화조도〉는 단순히 아름다운 새와 꽃을 묘사한 그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조화로운 인연, 생명의 풍요, 마음의 평온, 길상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작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행복도 있다” 라는 담담한 메시지를 전한다. 전통의 상징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감각으로 정제된 홍태현 화풍은 민화가 여전히 ‘삶을 위로하는 예술’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