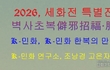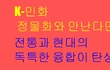K-컬처 이길주 기자 | 한국의 전통 민화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과 염원이 담겨왔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김송화 작가의〈무궁화와 두루미〉 역시 그 고유한 기원의 계보 위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화면 가득 피어난 무궁화와 청아한 자태로 창공을 가르는 두루미는, 단순한 자연의 재현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과 희망을 상징하는 상징적 풍경으로 다가온다.

작품 속 무궁화는 화폭의 중심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품고 있다. 꽃잎의 은은한 분홍빛 번짐, 잎맥의 세심한 묘사, 봉오리에서 만개한 꽃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마치 하나의 ‘생명 서사’처럼 펼쳐진다.
무궁화는 예로부터 ‘끊임없이 피는 꽃無窮花’, 곧 영속과 번영, 꺾이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김 작가는 이 무궁화가 지닌 정신적 의미를 화면 안에서 더욱 깊고 따뜻하게 확장했다. 그의 무궁화는 화려하기보다는 담백하고, 강렬하기보다는 오래 바라보고 싶은 한국적 정서의 빛을 품고 있다.
꽃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두루미는 작품의 또 다른 핵심 주제다. 두루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반에서 장수·길상·청정·고결함을 상징하며, 영적 세계와 인간 세상 사이를 잇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김송화 작가가 그린 두루미는 깃털 하나하나가 섬세한 선묘로 다듬어져 있으며, 힘차게 뻗은 날개는 미래를 향한 비상飛翔을 암시한다. 무궁화가 ‘뿌리내림’이라면, 두루미는 ‘날아오름’이다. 이 둘의 조우는 곧 한국인의 땅에 뿌리내리되,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듯하다.
민화는 본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태어난 그림이었다. 벽사용辟邪用, 초복용招福用,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실용적 목적이 가장 컸다. 무궁화와 두루미 역시 이러한 전통을 충실히 잇고 있다. 무궁화는 나라의 번영, 가족의 건강, 끊임없는 희망, 두루미는 장수, 청정, 명예, 길한 기운吉氣 이 두 상징의 결합은 단순한 조형미를 넘어 “복을 부르고, 액을 물리치며, 집안의 기운을 맑히는 그림”, 즉 전통 세화의 의미를 오늘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담아낸 작품으로 읽힌다.
작가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국적 미감과 섬세함과 절제의 미학은 김송화 작가의 화법은 한지 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물감의 농도, 잎과 꽃의 경계를 이루는 섬세한 선들의 조화, 그리고 붓질이 만들어낸 생명력 있는 번짐까지 모두 민화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정직한 손맛’을 계승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 깔린 절제된 색감은 화려함보다 품위와 고상함을 선택한 미학이며, 민화가 지닌 공예적 질감은 김 작가의 치밀한 조형 감각과 만나 현대적 아름다움으로 재탄생했다.
희망의 새해를 여는 그림 2026 세화전의 메시지와 맞닿다 2026년 병오년 세화전의 주제는 ‘어서 오세요 벽사초복僻邪招福’이다. 김송화 작가의 이 작품은 바로 그 주제와 완벽히 닿아 있다. 무궁화는 국운과 복을 불러들이고 두루미의 청정한 기운으로 액을 물리치는, 전체의 구성으로 새해 새아침의 ‘희망과 비상’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한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한국적 희망을 시각화한 신년의 상징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국의 꽃, 한국의 새, 한국의 마음, 김송화 작가의 무궁화와 두루미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바람을 품은 가장 한국적인 그림, 가장 따뜻한 바람의 한 장면이다. 세화歲畵가 지닌 벽사와 초복의 정신, 한국인의 끈질긴 생명력과 고결한 정신이 한 화면에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담겨 있다.
새해의 첫 장을 여는 그림으로서, 또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향한 상징으로서 이 작품은 충분한 힘과 울림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