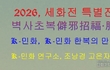K-컬처 이존영 기자 |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다. 그러나 부모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사회는 드물다.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효孝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말해지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늦게 준비되는 문제가 되었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모셔야 하는지, 어떤 예를 갖춰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몰라 감정부터 흔들린다. 이 혼란은 개인의 무지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가 이별을 준비하는 문화와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어떻게 보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도에서 봉안, 위패, 반혼, 기제사, 49재, 천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종교적 의례를 넘어 상실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문제는 이 흐름이 현대 사회에서 단절되거나 파편화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이별 앞에서 과도한 죄책감과 미련을 안고 살아간다. 잘 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붙잡지 않고 보내는 일은 차가움이 아니라 책임이다. 오히려 그것이 남은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효를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사회는 이별을 정리할 수 있는 공적 언어와 공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봉안과 위패, 추모 의례는 단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화적 기반이다. 이를 사적 선택으로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부모의 마지막을 ‘각자 알아서’ 치르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함께 준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효는 미담이 아니라 사회적 역량이다.
부모의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다면, 남은 삶은 덜 흔들릴 것이다. 준비 없는 이별이 반복되는 사회는 결국 더 큰 상실을 감당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애도의 말이 아니라, 준비의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