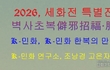K-컬처 이길주 기자 | 이 그림은 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덜어낸 끝에 남은 것이다. 굵은 붓선으로 쓰인 한 글자, 休(쉴 휴), 그러나 이 ‘휴’는 단순한 한자가 아니다.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는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에게 기대는 순간을 형상화한 하나의 사유思惟다.

화면 오른쪽의 형상은 승복을 입은 스님도, 특정 인물도 아니다. 무릎을 접고 허리를 세운 이 실루엣은 명상하는 ‘존재 그 자체’다. 얼굴도, 표정도, 장식도 없다. 오직 앉아 있는 선線만 있다.
왼쪽의 ‘人’은 곧게 서 있지만 긴장하지 않고, ‘木’은 뿌리도 잎도 없이 하나의 기둥처럼 서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은 앉아 있다. 이 작품에서 ‘休’는 쓰인 글자가 아니라, 앉은 자세다. 글자는 읽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공간이 된다.
이 작품은 단순한 캘리그래피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K-그라피(K-Graphy)라 부른다. 서구의 Calligraphy가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라면, K-그라피는 사유가 머무는 문자, 수행이 깃든 선이다.
붓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멈춤, 획의 힘보다 중요한 것은 여백,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 머무는 시간이다. 이 ‘休휴’는 장식용 문자가 아니다. 명상실 벽에 걸려도 좋고, 도시의 사무실 한쪽에 놓여도 좋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묻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휴休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우리는 쉼을 장소로 착각한다. 카페, 여행지, 휴가, 침대. 그러나 이 글자가 말하는 쉼은 다르다.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이 작품 속 인물은 명상 중이지만, 깨달음을 증명하지도, 답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앉아 있다. 그 앉아 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 한 글자는 조용히 말한다.
머무를 수 있는 문자 하나쯤이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열심히 증명하려 한다. 그래서 더더욱 머무를 수 있는 문자 하나쯤은 필요하다.
K-그라피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그 출발은 단 한 글자, 休. 쉼은 도망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해 스스로를 바로 앉히는 정좌正坐다. 그리고 이 글자는 오늘도 묵묵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지금, 당신은 잠시 앉아도 괜찮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