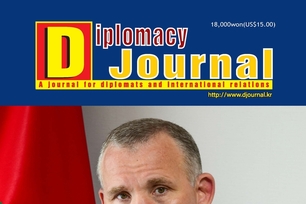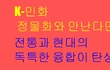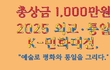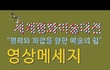K-컬처 장규호 기자 | 예술은 배우고, 전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가 낯설고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바로 “제자弟子”라는 호칭이다.
본래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이에게만 허락되던 깊은 언어였지만, 오늘날의 미술 교육 현장과 시장에서는 그 의미와 무게를 벗어난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과 합의 없이 제자라 불리고, 때로는 상업적 수단이나 권위 과시의 도구로 소비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이름을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술의 길 위에서 서로의 품격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제자’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저울질할 때다.
전통 속 “제자”의 의미, 그리고 오늘의 오해
‘제자’는 동양의 오랜 전통에서 단순히 배우는 사람을 넘어, 스승의 사상과 정신, 삶의 태도까지 전수받은 정신적 계승자를 뜻했다. 공자의 문도들, 불교에서 법맥을 이은 승려들, 도제식 수련을 거친 예술가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술 교육은 그 형태와 맥락이 다르다. 문화센터, 사설 학원, 작가 개인 아틀리에 등에서 단기간 실기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며, 수강생의 목적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때때로 위계적이고 과도한 호칭이 되며,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스승과 아무런 협의 없이 본인을 ‘○○ 작가의 제자’라고 자칭하거나, 작가가 수강생을 일방적으로 ‘내 제자’라 칭하며 심리적 구속을 유도하는 경우다. 이처럼 ‘제자’라는 말은 이제 남용을 경계해야 할 책임 있는 언어가 되었다.
미술시장의 혼란과 언어의 품격
실제로 미술시장에서는 ‘제자 자칭’으로 인해 전시 경력, 인증서, 작품 거래 등에서 명예의 오용과 브랜드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작가의 이름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그 권위가 상업적 마케팅 수단처럼 소비되는 현상도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예술 생태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제 미술계 전반이 관계를 정의하는 언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제자’라는 전통적 언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요청되는 시대다.
관계를 품격 있게 표현하는 새로운 호칭들은 예술 교육의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이제는 더 적절하고 건강한 언어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그 예다.
수강생受講生: 가장 중립적이고 정확한 표현
연구생硏究生: 예술을 깊이 탐구하는 이에게 적합한 명칭
문하생門下生: 장기적이고 공식적인 도제 관계일 때 사용
동인同人: 수평적 예술 동료를 뜻하는 고상한 표현
도반道伴: 함께 예술의 길을 걷는 벗
회원會員: 단체나 연구소 소속일 때의 공식적 호칭
예컨대, “○○ 작가의 민화를 배우는 연구생입니다.”라는 소개는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면서도, 스승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품격 있는 언어다.
말의 품격이 예술의 품격을 만든다.
예술은 자유롭고 창의적이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제자’라는 호칭은 더 이상 누구의 이름을 빌려 위세를 세우는 장식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바란다.
예술의 길을 걷는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정직하고 품격 있는 관계의 언어 위에서
더 단단하고 건강한 예술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그것이 예술의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우리 시대에 ‘제자’라는 말을 다시 올바르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필자 소개
담화총사, 재단법인 K-문화진흥재단 이사장
한국의 K-민화와 전통예술의 현대화를 이끌며,
문화 외교와 예술 인문정신 회복을 위한 다수의 국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